2017. 6. 15. 14:09ㆍ나의 이야기
장자(莊子) 雜篇
第32篇 列禦寇(열어구:列子) 제3장
<소인과 지인의 정신 자세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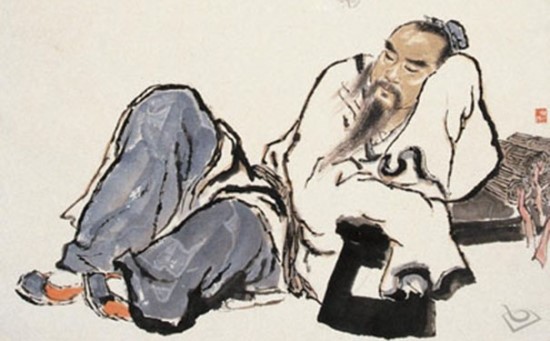
<소인과 지인의 정신 자세의 차이>
) -->
) --> 小夫之知(소부지지),不離苞苴竿牘(불리포저간독), 敝精神乎蹇淺(폐정신호건천), 而欲兼濟道物(이욕겸제도물),太一形虛(태일형허)。 若是者(약시자),迷惑於宇宙(미혹어우주), 形累不知太初(형루부지태초)。 ) --> |
) -->
필부(匹夫)의 지식은 선물이나 편지 따위의 하잘것없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라
번거롭고 하찮은 일에 정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그런 주제에〉 도(道)와 물(物) 양자를 잘 완성시키고
형(形)과 허(虛)를 크게 통일하려 하니
이와 같은 자는 광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얽매여서 태초의 도(道)를 알지 못한다.
) -->
--------------------------------------------
) -->
○ 小夫之知(소부지지) 不離苞苴竿牘(불리포저간독) : 필부의 지식은 선물이나 편지 따위의 하잘것없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함. 苞苴(포저)는 어육(魚肉) 등의 식품을 싸는 용구(用具)로 부들이나 대풀로 만드는데, 남에게 주는 선물 또는 선물을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뜻이다. 竿牘(간독)은 편지.
) -->
○ 敝精神乎蹇淺(폐정신호건천) : 번거롭고 하찮은 일에 정신을 지치게 함. 蹇淺(건천)은 막히고 천박하다는 뜻이다. 성현영(成玄英)은 “절뚝거리고 하찮은 일이다[跛蹇淺薄之事].”라고 풀이했다.
) -->
○ 欲兼濟道物(욕겸제도물) 太一形虛(태일형허) : 도(道)와 물(物) 양자를 잘 완성시키고 형(形)과 허(虛)를 크게 통일하려 함. 太一(태일)은 도(道)를 표현하는 太一이 아니라 크게 통일시킨다는 뜻이다.
※ 太一(태일) : 중국(中國) 철학(哲學)에서, 천지(天地) 만물(萬物)의 출현(出現) 또는 성립(成立)의 근원(根源). 우주(宇宙)의 본체(本體). 태을(太乙)
) -->
) --> 彼至人者(피지인자),歸精神乎無始(귀정신호무시), 而甘冥乎無何有之鄉(이감명호무하유지향)。 水流乎無形(수류호무형),發泄乎太清(발성호태청)。 悲哉乎(비재호)! 汝為知在毫毛(여위지재호모),而不知大寧(이부지대녕)! ) --> |
) -->
그런데 도(道)에 통달한 지인(至人)은
정신을 시작도 없는 도에 귀일(歸一)하여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하유(無何有)의 고을에서 달게 잠을 잔다.
물은 형체 없는 샘에서 흘러나와 태청(太淸)에서 유출(流出)되는 것이다.
슬프다!
네가 보잘것없는 지(知)를 추구함은 털끝처럼 작은 일에 관한 것뿐이고
위대한 편안함을 알지 못하는구나!”
) -->
------------------------------------------------
) -->
○ 至人(지인) : 노장학(老莊學)에서 도덕(道德)이 극치(極致)에 이른 사람 덕(德)이 높은 사람. 진인(眞人)
) -->
○ 彼至人者(피지인자) 歸精神乎無始(귀정신호무시) 而甘冥乎無何有之鄉(이감명호무하유지향) : 至人은 정신을 시작도 없는 도에 귀일하여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하유의 고을에서 달게 잠을 잠. 成玄英은 “無始(무시)는 현묘한 도의 근본이고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은 도경(道境)이다. 지덕을 지닌 사람은 움직일 때 늘 고요하여 비록 도와 물을 아울러 완성시키고도 정신이 응집되어 시작함이 없다. 그 때문에 위광(威光)을 누그러뜨려 세속과 함께 섞여서 늘 도가 있는 곳에서 잠잔다[無始 妙本也 無何有之鄕 道境也 至德之人 動而常寂 雖復兼濟道物 而神凝無始 故能和光混俗而恆寢道鄕也].”라고 풀이했다.
) -->
○ 太淸(태청) : 도교(道敎)에서 하늘을 일컫는 말.
) -->
○ 汝爲知(여위지) 在毫毛(재호모) 而不知大寧(이부지대녕) : 네가 보잘것없는 지(知)를 추구함은 털끝처럼 작은 일에 관한 것뿐이고 위대한 편안함을 알지 못함. 爲知(위지)는 지를 추구함. 成玄英은 “지혜를 부림이다[運智].”라고 풀이했다. 大寧(대녕)은 지적지도(至寂之道),위대한 편안함.
) -->본 자료의 번역은 전통문화연구회의 동양고전종합DB(http://db.juntong.or.kr)에서
인용된 내용입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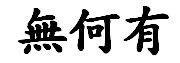
) -->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말로, 장자가 추구한 무위자연의 이상향을 뜻함.
) -->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응제왕(應帝王)·지북유(知北遊) 등 여러 곳에 나오는 말이다.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말로, 이른바 무위자연(無爲自然)의 도가 행해질 때 도래하는, 생사가 없고 시비가 없으며 지식도, 마음도, 하는 것도 없는 참으로 행복한 곳 또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
) -->
소요유와 응제왕편에서 무하유지향은 광막한 들(廣莫之野), 끝없이 넓은 들(壙垠之野)로 표현되어 있다. 누가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을 묻자, 장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 무하유지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물러가라. 너는 야비한 인간이로구나. 이 얼마나 불쾌한 질문이냐. 난 지금 조물주와 벗이 되려 하고 있다. 싫증이 나면 다시 아득히 높이 나는 새를 타고 이 세계 밖으로 나아가 아무것도 없는 곳(無何有之鄕)에서 노닐며 끝없이 넓은 들판에서 살려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 천하를 다스리는 일 따위로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가.”
) -->
지북유편에서는 무하유지향에 들었을 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제 시험 삼아 당신과 함께 유위(有爲)가 없는 무하유의 경지에서 소요하고 너와 나의 대립을 떠나 만물과 하나가 되는 도에 대해 말해 보겠네. 그리고 시험삼아 당신과 함께 무위의 입장에서 담담하고 조용하게,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물과 조화를 이룬 채 유유자적해 보겠소.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은 다른 사물로 가지 않을 것이므로 마음이 가서 닿을 바도 알지 못할 것이고, 갔다가 와도 사물에 집착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 멈출 곳을 알지 못할 것이오. 그래서 광대무변한 세계에 풀어 놓으면 아무리 큰 지혜로 엿보아도 그 끝이 다함을 알지 못할 것이오."
) -->
서양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도 결국은 어느 곳에도 없는 땅이라는 말이다. 장자가 말하는 무하유지향도 언어상으로는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이지만, 우리 의식 저 건너편에 확실히 존재하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가장 높은 안식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무하유지향 [無何有之鄕] (두산백과)
) -->
) -->
무하유향[無何有鄕]
아무것도 없는 세계. 허무 자연의 향토. 무하유지향(無何有之鄕). 장자(莊子)가 그리워하던 아상향(理想鄕)으로 지도지중유가락지지(至道之中有可樂之地 ; 지극한 도 가운데서 즐길 만한 곳)이라 함.
) -->
出六極之外 遊無何有之鄕(출륙극지외 유무하유지향 ; 사방과 상하 모두 벗어나 무하유지향을 거닌다.)<장자莊子 소요유逍遙遊>
不醉亦不醒 徑到無何有(불취역불성 경도무하유 ; 취하지도 깨지도 않아, 어느새 무하유지향에 이르노라.)<이인로李仁老 독도잠전희성정최태위讀陶潛傳戱成呈崔太尉>
晩來知舊無多子 醉裏生涯何有鄕(만래지구무다자 취리생애하유향 ; 늙어가니 오랜 친구 많지를 않고, 술 취한 속의 생애는 무하유지향이라.)<채수蔡壽 하일갈심독작냉소주~夏日渴甚獨酌冷燒酒~>
[네이버 지식백과] 무하유향 [無何有鄕] (한시어사전, 2007. 7. 9., 국학자료원)
) -->
) -->
[고문진보]75.和陶淵明擬古(화도연명의고) - 蘇軾(소식)
問我何處來(문아하처래) 我來無何有(아래무하유)
어느 곳에서 왔느냐고 나에게 묻기에 나는 무하유 꿈나라에서 왔노라 했다네.
http://blog.naver.com/swings81/220853979915
) -->
---------------------------------------------
) --> 
<원문>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道家 -> 莊子 -> 雜篇 -> 列御寇
) -->
7
小夫之知,不離苞苴竿牘,敝精神乎蹇淺,而欲兼濟道物,太一形虛。若是者,迷惑於宇宙,形累不知太初。彼至人者,歸精神乎無始,而甘冥乎無何有之鄉。水流乎無形,發泄乎太清。悲哉乎!汝為知在毫毛,而不知大寧!
) -->
필부(匹夫)의 지식은 선물이나 편지 따위의 하잘것없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라 번거롭고 하찮은 일에 정신을 지치게 만들면서 〈그런 주제에〉 도(道)와 물(物) 양자를 잘 완성시키고 형(形)과 허(虛)를 크게 통일하려 하니 이와 같은 자는 광대한 우주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얽매여서 태초의 도(道)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도(道)에 통달한 지인(至人)은 정신을 시작도 없는 도에 귀일(歸一)하여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하유(無何有)의 고을에서 달게 잠을 잔다. 물은 형체 없는 샘에서 흘러나와 태청(太淸)에서 유출(流出)되는 것이다.
슬프다!
네가 보잘것없는 지(知)를 추구함은 털끝처럼 작은 일에 관한 것뿐이고 위대한 편안함을 알지 못하는구나!”
) -->
'나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鮫魚皮 (0) | 2017.06.23 |
|---|---|
| 천애지기(天涯知己) (0) | 2017.06.15 |
| <형식만을 꾸미는 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0) | 2017.06.15 |
| <공자의 사람 보는 법 아홉 가지> (0) | 2017.06.15 |
| 腕下三百九碑 (0) | 2017.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