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만을 꾸미는 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장자(莊子) 雜篇 第32篇 列禦寇(열어구:列子) 제5장 <형식만을 꾸미는 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
) -->
<형식만을 꾸미는 자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 -->
) --> 魯哀公問於顏闔曰(노애공문어안합왈): 「吾以仲尼為貞幹(오이중니위정간),國其有瘳乎(국기유추호)?」 ) --> |
) -->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안합(顔闔)에게 말했다.
“나는 중니(仲尼)를 기용해서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병폐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 -->
-------------------------------------------------
) -->
○ 중니(仲尼) : 공자(孔子)
) -->
○ 魯哀公問於顔闔(노애공문어안합) : 魯(노)나라 哀公(애공)이 顔闔(안합)에게 물음.
) -->
○ 魯哀公(노애공) : 춘추시대(春秋時代) 말기(末期)의 노(魯)나라 군주(君主). 정공(定公)의 아들로, 이름은 蔣(장)이며, 재위기간은 B.C.494~B.C.468년이다. 공자(孔子)는 여러 나라를 편력하다가 B.C.484년에 노(魯)나라로 돌아와 B.C.479년에 죽었다. 〈德充符(덕충부)〉편 제4장
) -->
○ 顔闔(안합) : 성(姓)은 안(顔), 이름은 합(闔), 노나라의 현인(賢人)으로 전해진다. 〈人間世(인간세)〉편 제3장
) -->
○ 吾以仲尼爲貞幹(오이중니위정간) 國其有瘳乎(국기유추호) : 나는 중니를 기용해서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병폐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貞(정), 幹(간) 두 글자는 모두 ‘根幹(근간)’의 뜻. 瘳(나을 추) : (병이)낫다. 줄다, 줄이다
) -->
) --> 曰(왈):「殆哉圾乎(태재급호)! 仲尼方且飾羽而畫(중니방차식우이화),從事華辭(종사화사), 以支為旨(이지위지), 忍性以視民而不知不信(인성이시민이부지불신), 受乎心(수호심),宰乎神(재호신), 夫何足以上民(부하족이상민)! 彼宜女與(피의녀여)?予頤與(여이여)? 誤而可矣(오이가의)。 今使民離實學偽(금사민리실학위),非所以視民也(비소이시민야)。 為後世慮(위후세려),不若休之(불약휴지),難治也(난치야)。」 ) --> |
) -->
안합이 말했다.
“아니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중니는 지금 아름다운 깃으로 장식한데다가 또 아름다운 채색을 덧칠하여
화려한 말을 일삼아 지엽말단(枝葉末端)을 근본의 뜻으로 생각하고
자연의 본성을 무리하게 교정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서 믿음을 잃어버렸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신으로 재단합니다.
그러니 어찌 족히 백성들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임금님과 친합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럴진댄 나라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의 진실을 떠나 위선을 배우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후세를 위해 헤아려 볼 때 그만둠만 못합니다.
그로서는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 -->
-----------------------------
) -->
○ 殆哉圾乎(태재급호) :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임. 殆(태)는 아마도, 圾(급)은 위태로움(成玄英). 〈天下〉편 제5장에도 “殆哉圾乎天下(태재급호천하)”라고 하여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 -->
○ 方且飾羽而畫(방차식우이화) : 바야흐로 아름다운 깃으로 장식한데다가 또 아름다운 채색을 덧칠함. 羽(우)는 자연 그대로 아름다운 羽毛(우모). 林希逸은 “畫(화)는 채색함이다. 물건에 이미 채색을 입히고 또 깃으로 장식함이다[畫 采色也 物旣加以采色 而又以羽飾之].”라고 풀이했다. 而(이)는 爲(위)와 같다(林希逸).
) -->
○ 從事華辭(종사화사) 以支爲旨(이지위지) : 화려한 말을 일삼아 지엽말단을 근본의 뜻으로 생각함. 임희일(林希逸)은 華辭(화사)를 “화려하고 사치스런 표현이다[華靡之言].”라고 풀이했다. 支(지)는 枝葉(지엽). 旨(지)는 ‘근본’,
※지엽말단(枝葉末端) : 하찮은 것, 아주 지엽적인 것
) -->
○ 忍性以視民而不知不信(인성이시민이부지불신) : 자연의 본성을 무리하게 교정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서 믿음을 잃어버렸음을 알지 못함. 임운명(林雲銘)은 忍性(인성)을 “교만한 본성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猶云矯性].”라고 풀이했고, 진수창(陳壽昌)은 “자연의 본성을 교만하게 꾸밈이다[矯飾其自然之性].”라고 풀이했고, 임희일(林希逸)은 “교만이 넘침이다[矯激也].”라고 풀이했다. 視(시)는 ‘보여줌’. 示와 같다.
) -->
○ 彼宜汝與(피의녀여) : 그가 임금님과 친합니까? 汝(여)는 애공(哀公). 곽상(郭象)과 성현영(成玄英)은 彼(피)를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지만, 도홍경(陶鴻慶)이 지적한 것처럼 중니(仲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선영(宣穎)이 “중니가 과연 당신과 친합니까[仲尼果與汝相宜乎]?”라고 풀이한 것이 적절함. 宜(의)는 友誼(우의)의 誼(의)와 같다. 친하다는 뜻.
) -->
○ 予頤與(여이여) : 그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십니까? 予(여)는 豫(예)의 假借字(가차자). 즐겁다는 뜻이다. 頤(이)는 怡(기쁠 이)로 기쁘다는 뜻이다. 予(여)를 與(예)로 보고 頤(이)를 養(양)으로 보는 견해(郭象, 成玄英)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를 봉양하여 키우려는 것입니까.”라는 뜻이 된다.
) -->
○ 誤而可矣(오이가의) : 나라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誤則有之矣(오즉유지의)와 같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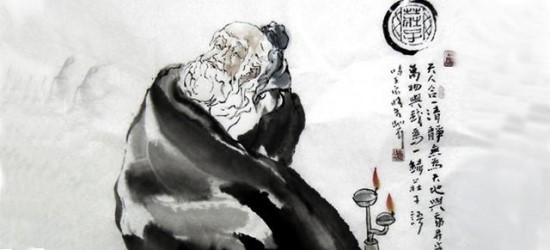
) -->
<원문>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道家 -> 莊子 -> 雜篇 -> 列御寇
) -->
9
魯哀公問於顏闔曰:「吾以仲尼為貞幹,國其有瘳乎?」曰:「殆哉圾乎!仲尼方且飾羽而畫,從事華辭,以支為旨,忍性以視民而不知不信,受乎心,宰乎神,夫何足以上民!彼宜女與?予頤與?誤而可矣。今使民離實學偽,非所以視民也。為後世慮,不若休之,難治也。」
) -->
) -->
노(魯)나라 애공(哀公)이 안합(顔闔)에게 말했다.
“나는 중니(仲尼)를 기용해서 나라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의 병폐가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안합이 말했다.
“아니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중니는 지금 아름다운 깃으로 장식한데다가 또 아름다운 채색을 덧칠하여 화려한 말을 일삼아 지엽말단(枝葉末端)을 근본의 뜻으로 생각하고 자연의 본성을 무리하게 교정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서 믿음을 잃어버렸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정신으로 재단합니다. 그러니 어찌 족히 백성들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임금님과 친합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즐겁고 기쁘십니까?
그럴진댄 나라 일을 그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자연의 진실을 떠나 위선을 배우게 하는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후세를 위해 헤아려 볼 때 그만둠만 못합니다. 그로서는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 -->